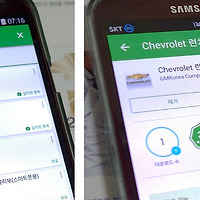패밀리카
새 차를 샀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세컨카를 샀다.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버지한테 새 차를 선물했다. 패밀리카가 필요했다. 아이와 아빠와 할머니와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모두 함께 탈 수 있는 큰 차가 필요했다.
그럴 때도 됐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이젠 차에 타면 제법 한 자리를 차지할 만큼이 됐다. 아이 물건도 무럭무럭 불어나고 있었다. 한번 차에 태우려면 1톤 트럭이라도 한 대 더 불러야할 정도였다.
게다가 아빠 차는 사실상 1인승인 미니카였다. 의자는 두 개 뿐이었다. 가족이 함께 타려면 할머니가 조수석에 앉고 아이는 무릎 위에 앉혀야 했다. 그러면 위험하다고 배웠다. 배운데로 안 산지는 오래됐다. 할아버지 자리는 없었다. 어차피 할아버지는 미니카를 아들만큼이나 못마땅해했다.
이렇게 패밀리카의 수요가 온 집안에 무르익고 있었다. 처음엔 당연히 미니카를 처분할 작정이었다. 아쉽긴 했다. 미니카는 시티카다. 어차피 서울을 싸돌아다녀야 하는 직업이다. 작은 시티카를 타면 가볍게 떠돌아다닐 수 있었다. 흔히 작은차의 장점을 주차와 연비에서 찾는다. 차가 작으면 주차가 편하고 기름도 다소 덜 먹는 건 사실이다. 작은차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다. 운전자의 마음이 가벼워진다. 자동차가 스쿠터나 자전거처럼 느껴진다. 그만큼 차를 몰고 나서는 게 거추장스럽지가 않다.
미니카를 처분하고 패밀리카를 타고 다닐 생각을 해봤다. 어차피 미니카든 패밀리카든 평소엔 1인승인건 마찬가지다. 6인승이든 9인승이든 일할 땐 혼자 타고 다니긴 마찬가지다. 이만저만한 낭비가 아니었다. 남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심사숙고해봤다. 무빙 오피스로 꾸며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차피 장돌뱅이 인생이다. 아예 차 안에 책상을 갖다놓고 노트북 펼쳐 놓고 일을 하며 다녀볼까 싶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다 할 수 있다.
참 낭만적이었다. 너무 낭만적이었다. 서울 하늘 아래에서 경관도 즐기면서 마음 편하게 주차해놓고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지 헤아려봤다. 한강고수부지 정도였다. 그나마도 주차비를 받았다. 다른 곳은 자칫하면 쫓겨나기 십상이었다. 주택가에 주차해놓고 일을 할 바에야 마음 편한 사무실이나 집에서 일하는게 훨씬 효율적이었다. 잘못하면 뻗치기를 하는 간첩 혹은 기자 혹은 국정원 요원으로 오해받기 일쑤였다. 서울은 멈춰선 안 되는 도시다. 끊임없이 어디론가 정처없어도 움직여야 한다. 서울에서 무빙 오피스란 푸른 꿈이었다.
진퇴양난이었다. 주말엔 패밀리카가 필요했다. 주중엔 패밀리카가 불필요했다. 필요와 불필요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다. 정답은 차 두 대 였다. 문득 왜 차가 두 대여선 안 되는지 자문했다. 유지비는 좀 더 들어도 결단코 안 될 이유 같은 건 없었다. 작은 차와 큰 차를 함께 타면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타고 다닐 수도 있겠다 싶었다.
패밀리카는 남자한텐 인생의 전환점이다. 어쩌면 결혼보다도 더 중대한 선택이다. 원래 진정한 남자한테 필요한 차는 의자 2개 바퀴 4개의 스포츠카다. 그 이상은 필요없다. 타고 밟고 달리면 그만이다. 자유롭다. 세단은 현실적 타협점이다. 세단까진 타고 태우고 밟고 달릴 수 있다. 아직은 자유롭다. 패밀리카는 차원이 다르다. 남자는 더 이상 차의 주인이 아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운전은 아이와 가족이 한다. 남자는 운전수일 뿐이다. 크고 넓지만 필요한만큼 불필요한 공간 투성이다.
패밀리카를 선택한다는 건 남자가 이제 남자를 넘어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된다는 의미다. 인생의 전환점이다. 남자는 패밀리카에서도 주인 행세를 하려고 든다. 패밀리카를 캠핑카로 포장하려고 든다. 패밀리카를 타고 아이의 어린이집만 오가는 게 아니라 모험을 떠나려고 든다. 패밀리카로 인생 모드를 전환한 남자가 곧바로 지붕에 짐칸을 매달고 텐트와 침낭부터 구매하는 이유다. 비록 패밀리카를 타고 있어도 남자는 여전히 모험가이고 싶다. 사실 패밀리카들은 남자의 이런 약점을 잘도 공략한다. 현실에선 아이들 유모차나 실어나르고 각종 짐들로 가득찰테지만 광고에서만큼은 차를 타고 아프리카 사파리 한 복판으로 야영을 떠나는 것처럼 꾸며놓는다. 남자가 조금 더 쉽게 굴복하게 만드는 셈이다. 패밀리카를 타도 여전히 인디아나 존스일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론 패밀리카를 타는 순간 패밀리맨이 된다.
SUV 차종이 등장한 것도 비슷한 상술 덕분이었다. SUV는 199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부흥시켰다. SUV는 이전까진 존재하지 않았던 차종이었다. 1990년대 미국 자동차 시장의 주요 소비자층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반항아로 살았던 히피 세대였다. 젊은 히피들도 나이를 먹고 부모가 됐다. 한때의 히피들한테도 바야흐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패밀리카 말이다.
히피들은 그들의 부모들처럼 점잖은 세단에 유모차를 싣고 대형 마트를 오가며 살고 싶지 않았다. 그건 히피로 살았던 그들의 젊은날에 대한 모독이라고 느꼈다. 물론 그들도 이미 부모 세대들처럼 대형 마트에서 대량소비를 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SUV는 왕년의 히피 세대들한텐 썩 괜찮은 타협책이었다. SUV의 본질은 패밀리카가 아니다. 온로드용 차와 오프로드용 차의 특징을 반반씩 혼합한 하이브리드 차다.
SUV는 비록 도시의 온로드를 달라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오프로드로 나갈 수 있다는 환상을 머금은 차종이었다. SUV를 몰고 출퇴근을 하면 지금은 회사를 오가지만 주말엔 야외로 나가서 자연을 만끽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도시화된 왕년의 히피들한텐 더 없이 적절한 차종이었다. SUV는 그야말로 바퀴 돋힌듯 팔려나갔다. 소비자들의 이중적 욕구를 이중화된 차종이 채워준 셈이었다.
딱 1990년대 부모가 된 히피들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느꼈다. 패밀리카를 살 것인가. 미니카를 포기할 것인가. 더 이상 SUV는 대안이 아니었다. 1990년대 이후 20년 동안 SUV는 타락해버렸다. 온로드와 오프로드의 특징을 겸비한 차종에서 껍대기는 오프로드용이지만 실제론 온로드용인 차가 돼 버렸다. 오프로드에 나가서 자갈이라도 튀면 수리비 견적만 수십수백만원이 나오는 고급 차종으로 변질돼버렸다. 거친 척 굴지만 실제론 소심하기 짝이 없는 마초남자처럼 됐다.
결단을 내렸다. 패밀리카와 미니카를 모두 타기로 했다. 도시인으로서의 자유로움과 가장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찾아낸 타협점이었다. 2인승 차와 9인승 차를 한꺼번에 타기로 했다. 일단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아이는 대만족이었다. 아이는 뒷좌석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며 타고 나니기 시작했다. 마치 모든 좌석이 자기 것인 것처럼 굴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 이상 손녀 때문에 짐짝처럼 차에 구겨 탈 필요가 없어졌다. 가족끼리 여행 다니기에도 좋았다. 오프로드까진 아니어도 도시를 떠날 자신감 정도는 생겼다. 야외에 나가도 든든한 믿을 구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도 미니카가 있었다. 여전히 도시 이곳 저곳을 가볍게 쏘다닐 수 있었다. 가끔 바퀴 4개인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유로웠다. 여전히 젊은 남자 같았다. 자유는 남자의 본질이다. 패밀리카는 자유롭지만 사실 자유롭지 않다. 가족 앞에서 남자는 자유로울 수도 자유로워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패밀리카는 도시 바깥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지만 그건 구속된 자유다.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미니카야말로 진짜 자유롭다.
한편으론 씁쓸했다. 그런 남자구나 싶었다.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에서 패밀리맨도 도시인도 되지 않았다. 둘 다가 되고 싶었다. 결국 두 대 모두를 선택했다. 자유도 의무도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순간에 용감하게 패밀리카를 선택하는 남자들이 존경스러웠다. 그렇게 두 대를 몰고 다닐 작정이었다.
할아버지가 변수였다. 할아버지가 패밀리맨이란 걸 깜빡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는 자유보단 책임을 우선시하며 살아왔다. 자동차라면 당연히 크고 튼튼해야 한다고 믿었다. 자유로운 게 남자다운 게 아니라 믿음직한게 남자답다고 믿었다. 자동차 취향도 그 연장이었다. 할아버지는 자유분방한 아들을 늘 마뜩치않게 여겼다. 아들이 드디어 패밀리카를 선택하자 대견해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차가 두 대였다. 아들은 결코 아버지처럼 살 수는 없었다. 아들한테 남자답다는 건 자유롭다는 의미였다.
결국 할아버지가 패밀리카를 가져갔다. 어차피 아이를 매일 태우고 다니시는 건 할아버지였다. 아이를 위한 차였으니 할아버지가 패밀리카를 모는 게 마땅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남자한테 더 없이 어울리는 선물이었다. 대신 할아버지는 아들의 미니카를 인정했다. 더 이상 큰 차를 타라는 잔소리를 안 하게 됐다. 이것도 일종의 세대간 타협이었다.
남자한테 자동차는 인생의 시기를 상징한다. 어린 남자한텐 차가 없다. 그때 차란 남자가 되고 싶다는 꿈의 상징이다. 결국 이런 저런 차를 타보게 된다. 젊은 남자한테 차는 마치 이런 저런 여자를 만나보는 자유 연애와 같다. 자기한테 어떤 삶이 어울리는지 탐구하는 것과 같다. 차종은 곧 남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중년 남자는 기로에 서게 된다. 패밀리카와 스포츠카 사이 어딘가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 선택은 각자마다 다르다. 어떤 여자와 결혼했느냐만큼이나 결정적이다. 노년 남자한테 차는 가족과 같다. 노년 남자한테 가족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물론 이상한 일도 일어난다. 어린 아들이 크면 아빠한테 다시 패밀리카를 포기하고 스포츠카를 타라고 조른다. 아들은 남자가 되고 싶다. 아빠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다. 물론 엄마가 반대한다. 어쨌든 지금, 아이의 할아버지는 패밀리카를 몬다. 아이의 아빠는 미니카를 몬다. 이게 남자의 인생이다.
글 l 신기주(에스콰이어 기자)